김미월 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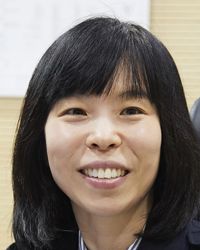
출판사 편집자가 전화로 원고료가 입금되었음을 알렸다.
애초에 고지한 날짜보다 입금이 며칠 늦어진 사정을 밝히며 죄송하다고 하기에 나는 뭐 그 정도
일로 그러시느냐 반문했다. 물론 약속은 확실하게 지키는 것이 마땅하지만 어쩌다 사정이 있으면
이행이 좀 늦어질 수도 있지 않은가.
상습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다면 누구나 그 정도는 충분히 헤아려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했다.
아닙니다. 편집자가 말했다. 그건 옛날 사람들 얘기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흔히들 일컫는 MZ 세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는데, 요즘 이삼십대 젊은 작가들은
원고를 청탁하면 고료부터 물어본단다. 그거야 그럴 수 있는데 입금일이 언제인지도 묻는단다.
그리고 입금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바로 문의 전화를 한다고 했다.
옛날 작가들은 대부분 출판사에 돈 관련 문제를 문의하거나 요구하는 일을 어려워하여 정작 속으로는
전전긍긍할지라도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했는데, 요즘 작가들은 과거의 그런 분위기를 전혀 이해하지도
납득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편집자는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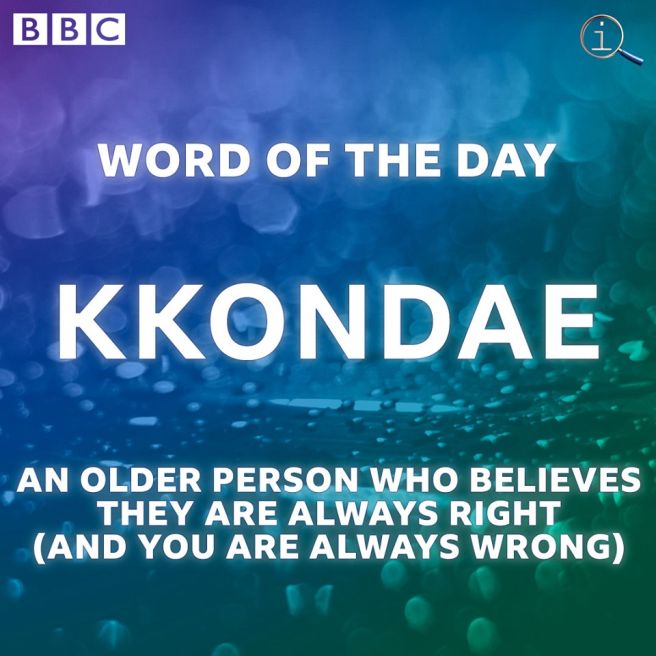
문득 얼마 전 대학에서 학기 마지막 수업을 하던 날이 떠올랐다.
원래는 수업 끝나고 종강 파티를 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내가 갑자기 일이 생겨 종강 파티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했고 그래서 아쉬우나마 학생들에게
커피라도 사겠다고 했다. 강의 시간에 다 같이 카페에 갈 수는 없으니 강의실로 커피를 배달시키자고
한 것이었다. 학생들이 학교 근처의 괜찮은 카페들을 추천하면서 일사천리로 주문이 시작되었다.
문제는 그것이 내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배달앱이 켜져 있는 나의 휴대폰이 학생들의 손에서 손으로 건너갔다.
그들은 저마다 앱 화면을 골똘히 들여다보고 신중하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렇게 하여 강의실을 한 바퀴 돌며 모든 학생의 손을 거친 휴대폰이 마침내 주인의 손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확인한 것은 정확히 학생들의 인원수와 일치하는 가짓수의 다종다양한 음료들의
내역이었다. 그중 커피 메뉴는 딱 하나였는데 그마저도 샷 추가에 시럽 추가에 얼음은 곱게
갈아달라는 요구가 야무지게 덧붙여져 있었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누구도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당황하는 내가 한심해서 더 당황했다.
그러니까 내가 막연히 상상했던 풍경은 오래전부터 익숙하게 보아온, 저는 아무거나 다 좋아요,
그냥 한두 가지 메뉴로 통일하는 게 좋겠어요, 같은 것이었으리라.
나는 어쩔 수 없이 꽉 막힌 옛날 사람이구나 하고 자조하며 서둘러 결제를 마쳤다.
정말 당혹스러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음료 값을 내게 어떤 방식으로 지불할지를 문의한 것이다.
아니, 여러분이 돈을 왜 내요? 선생이 사면 학생은 즐겁게 마시면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걸 다 사시는 건 불합리해요. 맞아요. 각자 원하는 것을 자기 돈으로
사 먹는 게 저희도 마음 편해요. 어른이라는 이유로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사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별로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생생하게 귓가에 재생되는 듯한 착각 속에서 나는 편집자에게 대꾸했다.
그럼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 저도 압니다.
출처 : 강원일보 [김미월 소설가]
'소소한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휩쓸리지 않을 권리 (0) | 2023.07.24 |
|---|---|
| 현타(現time) (0) | 2023.07.21 |
| 서로의 편이 되어주기 (0) | 2023.07.20 |
| 아이 없는 도시 (0) | 2023.07.18 |
| “다른 곳에 주차”…종이 박스에 적힌 이유 ‘실소’ (0) | 2023.07.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