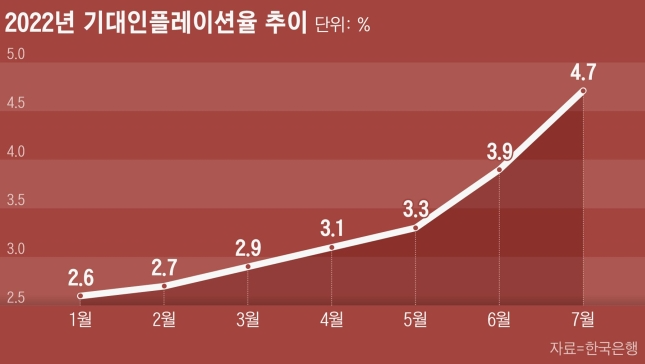
넷플릭스 드라마 '종이의 집'은 조폐국을 장악한 강도단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풀어가는 범죄물이다.
한국판으로 리메이크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강도단을 총지휘하는 '교수'라는 인물은 인질극을 벌이는 동안 막대한 신권을 찍어 도주한다는 계획을 짠다.
그는 "우리는 그 누구의 돈도 훔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물론 이런 논리는 엉터리다.
강도단이 빼돌린 신권이 시중에 풀리면 통화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면 시민들 호주머니에서
몰래 돈을 훔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누구의 돈도 훔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두의 돈을 훔치는 격이다.
인플레이션을 '보이지 않는 도둑'으로 부르는 이유다.
다만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현실을 떠올리면 교수의 말은 나름 일리가 있다. 통화량이 수조 원쯤
늘어난다고 곧장 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란 걸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중앙은행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물가는 멀쩡해 보였다. 적어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지난 3월까지는 그랬다.
요즘은 고물가와 금리 인상 탓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외환위기급 경기 침체가 기정사실이
된 것처럼 뒤숭숭하다.
최근 필자가 접한 기업인들은 거의 곡소리를 내고 있었다. 원가 상승 탓에 이익률은 반 토막이 났는데
매출 감소, 임금 인상 부담은 확 커졌다. 우량 기업이 앞장선 자금 확보 경쟁도 심상치 않다.
이런 분위기로 몇 달이 지나면 낙오자가 속출할 것이다.
그러나 물가 변동이란 오묘한 것이다. 양치기 소년의 늑대 경보처럼 고물가 공포가 허상에 그쳤던
경우가 과거에는 종종 있었다.
1994년이 그랬다. 앨런 그린스펀이 연준 의장을 맡았을 때였는데, 1994년 초 3.05%였던 기준금리를
1995년 4월 6.05%까지 끌어올렸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미국 채권시장이 초토화됐다.
1조달러가 날아갔다. '채권시장 학살'이란 말이 그때 나왔다. 신기한 건 당시 미국 국민들이 느낀 충격은
미미했다는 점이다. 물가 대란도, 실물경제 위기도 없었다.
대외 요인에 휘둘리는 한국 물가도 마찬가지다. 이명박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물가 때문에 애를 먹었다.
배럴당 50달러 하던 유가가 2008년 집권 초기에는 140달러까지 치솟았다.
당시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지는 않다. 결과적으로 국가경제도
박살 나지 않았다. 물가지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안정됐던 주택가격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1994년 연준의 호들갑은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도 가끔 인용하는 사례다.
그는 "인플레이션 공포가 과장됐다"는 입장인데, 그 전제에 연준이 있다.
통화당국이 작정하고 물가 대응에 나서면 효과가 꽤 발휘된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지난해 2월 "한 세대 동안 경험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다가 조롱에 시달렸다. 지금은 상황이 뒤집어져 선견지명의 현인으로 추앙받고 있지만
세상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른다. 서머스 교수는 "인플레이션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연준을 맹공격하고 있다.
크루그먼과 서머스 누구 말이 옳은지는 지금으로선 판단 불가다.
인플레이션 파이팅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시장에서도 인플레이션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론과 근거 없는 공포심 때문에 통화당국의 과잉 대응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병존한다.
비상 상황에 대비는 하되,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웅크리고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냉철한 안목과 유연한 대응이다. 미리 주눅이 들어 미래 투자를 놔버리면 기회도 사라진다.
[이진우 매일경제 국차장 겸 지식부장]
'소소한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60세 이상도 국민연금 계속 내야"…OECD 또 충고 (1) | 2022.09.21 |
|---|---|
| 2023년 증여세, 상속세 '세금폭탄' 피하려면 반드시 알아야할 2가지 (박명균 세무사 2부) (0) | 2022.09.14 |
| 유리지갑의 ‘건보료 설움’… 월급 7% 떼이는 시대 (0) | 2022.08.26 |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0) | 2022.08.10 |
| 연차유급휴가, 사용하지 않은 분량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 (0) | 2022.08.03 |



